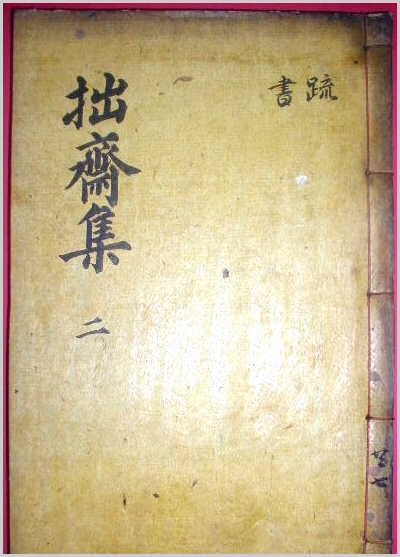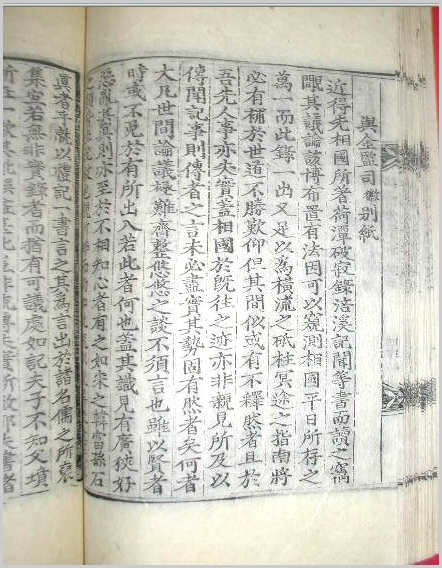본문
|
|
|
(2006. 8. 25. 항용(제) 제공) 가) 졸재집 경매 입수 과정 (1) 경매 입수일 : 2006. 8. 25. (2) 입수자 : 김항용(제) (3) 입수처 : 코베이 (4) 경매 입수액 : 5만원 (5) 사진
<졸재집>
<관련 부분> (與金監司 徽 別紙)
(6) <졸재집>의 저자 유원지 소개
유원지(柳元之) 1598(선조 31)∼1678(숙종 4).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풍산(豊山). 초명은 경현(景顯). 자는 장경(長卿), 호는 졸재(拙齋). 영의정 유성룡(柳成龍)의 손자로, 장령 여(#여02)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남양홍씨(南陽洪氏)로 군자감정 세찬(世贊)의 딸이다. 할아버지 성룡과 작은아버지 진(袗)에게서 수학하였다. 일찍이 황간·진안 등지의 현감을 역임하였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에는 안동지방의 의병장 이홍조(李弘祚)와 함께 활약하였다. 학문에 열중하여 사서오경과 제자백가에 능하였으며, 특히 성리(性理)·이기(理氣)·상수(象數)·천문·지리·예설 등에 통달하였다. 이기설에 있어서 주로 이황(李滉)의 이발기발설(理發氣發說)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이이(李珥)의 설을 반박하였으며, 예설에 있어서는 효종의 복상문제(服喪問題)에 송시열(宋時烈)이 의정(議定)한 기복제(朞服制)를 부인하고 3년설을 주장하였다. 안동의 화천서원(花川書院)에 봉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졸재집》 14권 7책이 있다.
(7) 졸재집 내의 관련 내용 <졸재집>(拙齋集. 졸재 유원지 저)에 유원지가 감사 김휘에게 보내는 별지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는 하담 김시양선조님의 하담파적록과 부계기문 등에 나오는 학봉 김성일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글입니다. 학봉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글에 대한 이견과 함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글입니다. 팽팽한 논리 전개와 이의 제기가 재미있습니다.
학봉일고(鶴峯逸稿) 부록 제3권 학봉김문충공사료초존(鶴峯金文忠公史料鈔存) 하 《졸재집(拙齋集)》 [졸재 유원지(柳元之)] 감사(監司) 김휘(金徽)에게 보낸 별지(別紙) 근일에 선대(先代)의 상국(相國) 김시양(金時讓)이 저술한 《하담파적록(荷潭破寂錄)》과 《부계기문(涪溪記聞)》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 중략 - 그중에 혹 의심이 확 풀리지 않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 중략 - 대개 상국께서 이미 지난 사적(事跡)에 대해서 역시 친히 본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것을 가지고 기록했다면, 전한 사람의 말이 반드시 모두가 사실이 아닐 것임은, 그 사세가 참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 중략 - 친히 본 것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잘못 들은 것을 가지고 잘못 전하여 더욱더 그 참을 잃은 것이겠습니까. - 중략 -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금 상국께서 기록한 글 가운데에서 사실에 어긋난 곳이 있으면 대략 산삭(刪削)을 가하는 것이 적절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중략 -
《부계기문》에 학봉 선생이 일본에 사신 갔을 때의 일을 논하면서 말하기를, “자질구레한 절목(節目) 사이에 발끈 화를 내어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은 반드시 상국께서 잘못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해사록(海槎錄)》은 그 당시에 세상에 반포되지 않았으니, 상국께서 반드시 미처 이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학봉 선생께서 일본에 있을 때 행한 일의 전말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이에 들은 바를 진술하니 바로잡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옛날 춘추 시대 진(晉) 나라가 제(齊) 나라를 쳐서 그 땅에 침입해 들어가자, 제 나라에서 국좌(國佐)로 하여금 진 나라에게 화친을 청하게 하였는데, 진 나라 사람들이 제 나라로 하여금 경내의 모든 토지의 이랑을 동쪽으로 향해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제 나라에게 자기 나라를 향하여 굴복하는 의사를 보이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국좌는 의연한 자세로 이를 꺾으면서, 차라리 온 나라가 죽을지라도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 진 나라 사람들이 감히 그 뜻을 꺾지 못하고 마침내 화친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뒤에 송(宋) 나라 이종(理宗) 때 원(元) 나라 사람들이 침범해 오자, 송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화친하기를 요구하면서, 원 나라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기로 하였는데, 서산(西山) 진덕수(眞德秀)가 이종에게 상주하여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무릇 두 나라가 서로 화친하는 즈음에는, 상대편에게 범하기 어려운 기색을 보이면 화친하기가 쉽고, 상대편에게 쉽게 엿볼 수 있는 기색을 보이면 화친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지금 조정에서는 원 나라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그 가부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한결같이 그들의 뜻에만 따르면서 화친을 빨리 성사시키려고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마음만 더욱 열게 하는 것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하여 제 나라 국좌가 진 나라 사람을 꺾었던 일을 들어서 증거를 대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를 살펴본다면, 토지의 이랑을 동쪽으로 향하게 하는 일은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서, 이해에 관계될 것이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서 죽기로써 이를 다툰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랬겠습니까. 진실로 그 한마디 말에 대해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사이에 나라 형세의 경중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학봉 선생께서 왜노를 대하면서 대처하는 방도가 장차 어떠해야 했겠습니까?
국본사(國本寺)의 연회에서 평의지(平義智)가 교자(轎子)를 탄 채 섬돌까지 이르렀으므로, 학봉 선생이 일어나 나와서 그 연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비전주(肥前州)에서 음식을 보내왔을 적에는 그들이 보낸 서신 중에, ‘조선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입조(入朝)했다.’고 하였으므로, 선생은 물리치고 그 음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상사(上使)가 관백(關白)의 행차를 관광(觀光)하려고 하자, 선생은 불가하다고 했으며, 상사가 예복 차림으로 왜국의 국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선생은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상사가 관백의 측근에게 뇌물을 써서 국서(國書)를 빨리 전하려고 하자, 선생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국서에 대한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레 계빈(界濱)에 나가 있었으며, 왕명을 전하기 전에 상사가 영인(伶人)으로 하여금 풍악을 베풀어서 왜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옳지 못한 일 가운데 큰 것입니다. 그리고 관백에게 뜰에서 배례하는 것이 비례(非禮)임을 바로잡고자 하여, 현소(玄蘇)와 더불어 질문하여 규식을 정한 것은 또 국가의 큰 체면에 관계된 일이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분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계빈으로 나온 뒤에야 관백의 답서가 비로소 왔는데, 그 언사가 아주 패만(悖慢)하여서 더욱더 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전후에 걸쳐 왜국의 중 현소와 그 나라의 사신 접대하는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따졌던 것입니다.
무릇 이와 같은 따위는 여러 나라의 국좌가 다투던 일과 비교해 본다면, 그 경중과 대소가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자질구레한 절목 사이’라고만 말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생이 상사에게 답하는 서신에 이르기를, “섬오랑캐가 비록 무지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편안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내버려둔 채 따지지 않는다면, 나라를 욕되게 함이 아주 심할 것입니다. 사신이 치욕을 당하는 것은 바로 국가가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이처럼 나라를 욕되게 하는 서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군부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우리 삼한(三韓)의 사대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던 것입니다.
그 밖의 것들도 모두 이와 같은 따위로서, 섬오랑캐들의 사납고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꺾고 우리 문화 민족의 기운을 편 것이 가을 서리나 뜨거운 햇볕과 같아서 그들의 마음을 저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저 왜인들이 모두 두렵게 여겨 공경하면서 감히 업신여기는 마음이 없게 되었으니, 그것들을 자질구레한 절목으로 보아 다투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물며 선생이 왜노들과 변론한 것은 오직 도리에 따라 억눌러서 의리로 돌아가게 해서 그들의 완악한 태도를 고치게 하는 데 그칠 뿐이었으며, 애당초 너무 심하여 그들을 격동시켜서 노여움을 초래하고 소란을 야기시킨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른바 ‘발끈 화를 냈다’는 글은 또한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아아, 저들이 비록 인의(仁義)는 부족하지만 흉악하고 교활함은 남음이 있으니, 만약에 예의로써 자신을 검속하지 못하고 그들의 의사에만 곡진히 따라서 그들의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면, 의리에 관계된 것은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천심(淺深)을 엿보아 우리의 강약(強弱)을 시험하면서 조종하는 것이 장차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선생께서 안색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여 그들에게 놀아나지 않은 일이 없었더라면, 그들에게 얕보이고 낭패를 당하여 나라에 치욕을 끼침이 또한 이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또한 자질구레한 절목이라고 여겨서 그 사이에 살펴서 처리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앞서 사신으로 갔던 10여 명’ 운운한 글은 또한 모두 박절한 말이니, 아마도 이 말을 선생께 써서는 안 될 듯합니다. 일찍이 선생께서 복명(復命)하였을 때에 올린 서계(書啓)를 보았는데, 그 서계에는 단지 말하기를, “신은 그들이 반드시 쳐들어오리라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으며, 물러나와서 나의 선인(先人)과 더불어 말할 때에도 또한 이르기를, “낸들 어찌 왜놈들이 끝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필할 수 있겠는가마는, 황윤길(黃允吉)의 말이 너무 심하여 마치 왜놈들이 곧바로 사신들의 뒤를 따라서 쳐들어올 것처럼 말하였으므로, 이런 두려움을 해소시켜 준 것일 뿐이네.” 하였습니다. 이런 말들이 과연 단정을 내리고 고집을 부려 반드시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리고 상사 황윤길이 왜놈들이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한 말 또한 어찌 참으로 왜적들의 정세를 알고서 한 말이겠습니까. 대개 일본에 있었을 적에 마음이 약하여 겁을 집어먹은 잘못을 꾸며대어 가리고자 그렇게 말한 데 불과할 뿐입니다. 하물며 조정에서도 애당초 이런 말들로 인하여 왜적들을 방비하는 일을 느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선생 때문에 일을 그르쳤다고 하면서, 국사를 그르친 죄를 선생에게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주(海州)의 부용당(芙蓉堂)에 선생의 제영(題詠)이 있었는데, 왜노가 푸른 비단으로 이를 싸가지고 갔으니, 마음속으로 깊이 복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말하는 태도와 웃는 모습으로써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